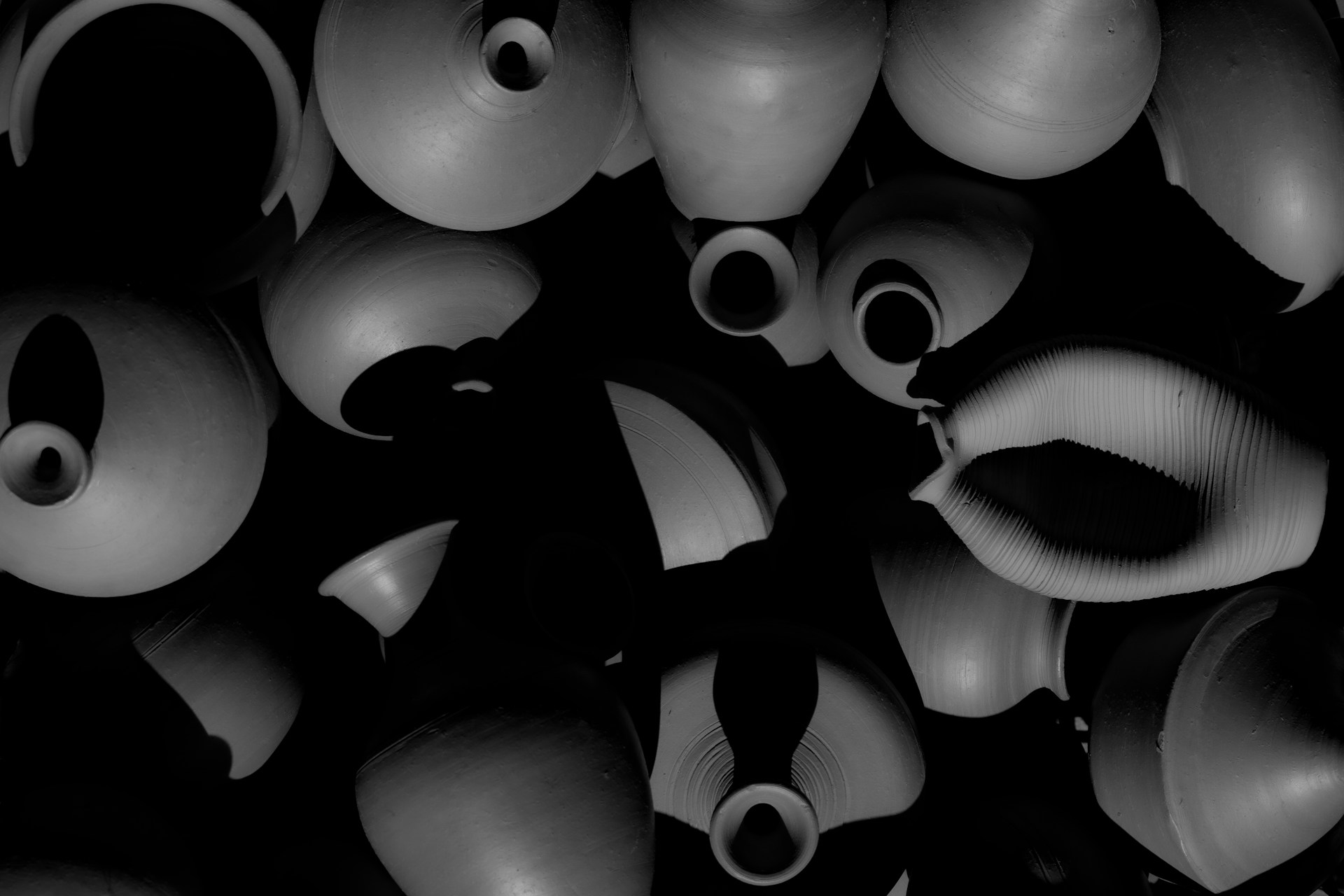한 발 짝 정도만 더 도자기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도자기가 도기와 자기를 묶어서 만든 용어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양쪽의 구별점 내지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도자기를 시방, 지금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별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전에, ‘도자기’라고 부르는 말의 기원부터 추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기(陶器)는 한자음으로 이해가 어려운데, 영어로는 흙으로 구웠다는 의미에서는 어슨웨어(earthenware)입니다. 토기로도 번역 가능합니다. 자기(磁器)는 포셀린(porcelain)으로, 이 단어는 1530년대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에서의 ‘개오지조개, 어린 암퇘지’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개오지조개는 표면이 반짝거리고 매끈한데 이를 도자기 표면에 비유한 것이라면, 새끼암퇘지는 그 생식기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 용어가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개오지조개에서 개오지란 용어도, 한국 최초의 패류학자인 유종생이 어촌에서 불리는 ‘방송금지용어’를 최대로 수용하면서도 그 음운을 살릴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하기 위해 상당한 고심 끝에 결정하였습니다. ‘개+오지’는 ‘가짜+오지그릇(옹기그릇)’이라는 뜻으로 만들었는데, 그 분이 포셀린의 어원까지는 아마도 살펴보지 않았겠지만, 우연의 일치 치고는 너무나도 절묘한 안성맞춤의 학술용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지그릇을 뜻하는 도(陶)는 한중일이 모두 오지그릇(토기/옹기류)을 지칭하는 단어로 통일되어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뜻하는 자(磁)는 중국에서는 자(瓷)로 쓰고, 한일은 모두 자(磁)로 씁니다. 고려, 조선에서는 자(磁)와 사기(砂, 沙)라는 말을 혼용했는데, 보통 우리는 사기그릇, 사기장 등으로 사기가 곧 자기로 인식하였고, 이는 도자기 그릇류를 통칭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자(磁)는 중국 북송 때의 북방지역인 하북성(河北省) 자현(磁縣)의 자주요(磁州窯)에서 ‘자(磁)‘가 포셀린을 뜻했는데, 이 단어가 한일로 들어왔다고 추정합니다. 정작 중국에서는 자(瓷)가 더 우세하여 지금은 거의 모두가 이 단어가 사용하며, 더 나아가 도기와 자기를 총괄하는 단어로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북성 자현에는 자토(磁土)가 많아 그 명칭 붙었는데, 당나라 초기인 623년, 6개 지역을 총괄하는 자주총관부(磁州總管府)를 설치하면서 자주(磁州)가 처음 공식 등장하였습니다.
자주요 유형의 도자기는 자주라는 지역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북방의 넓은 영역과 요나라(遼 916-1125), 서하(西夏 1038-1227), 금나라(金 1115-1234)를 포함한 북방 이민족까지 직접 제작하면서 흥미로운 도자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하는 몽골에 의해 철저히 멸족된 탓에 국가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1983-86년 영하회족(寧夏回族)자치구의 주도인 은천시(銀川市)의 영무요(靈武窯) 터에서 3차례 발굴을 통해 서하의 도자기가 자주요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자주요의 다양한 기법이 사라진 이후 170여년 후인 조선 초의 분청사기 기법에서 다시 유사하게 재현되어, 확실한 문헌적 증거는 없지만 조선의 분청사기가 자주요 계통의 기법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국의 몇몇 도예가들이 분청사기를 한국만의 독창적 도자기이자 제작기법이라고 높이 올려 평가하는데, 분청사기가 자주요 도자기의 기법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분청사기를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 간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는데, 자주요가 조선으로 유입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기물이 곧 증거인 도자기사에서 양 도자기 기법 사이의 밀접한 유사성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또 각설하고, 자(磁)와 자(瓷)는 이렇게 자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 글 작성:(주)시방